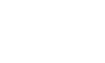그곳의 물은 늘 파랗기보다는 검은 빛이었다. 바람은 함구했고 볕은 빼곡한 나뭇가지 사이를 꾸역꾸역 비집어댔다. 고요하다. 물은 말이 없고, 흔들리는 것은 오로지 짧은 머리칼, 아직 초여름이기에 하얀 어깨, 늘 용감했던 눈동자, 그리고 이마에서 탄생한 땀방울 정도였을 것이다. 마주한 눈들은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했지만, 그래도 용감한 쪽은 늘 정해져 있었다. 꿀꺽 침을 삼키는 소리는 잠 든 물과 침묵하는 바람 사이에서 차라리 소음이었다.
“사랑해.”
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지는 않는다. 어리석고 조급하며 거칠었지만 그래도, 그렇게까지 모르지는 않았다. 단어들, 어떻게든 적어 넣을 수 있었던 단어들, 그 사이에 분명 있었던 단어들로 구성된 문장. 이렇게나 확실한 것이 없다는 듯 단단한 눈동자를 마주대고 내어놓은, 너무 큰 문장. 여전히 흔들리는 어깨, 하얀 어깨. 그 어깨를 붙잡고 지문이라도 새길 요량으로 꾹 누르고 싶은 충동을 참으려 주먹을 쥐었다. 무엇이 무서웠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. 두려울 것은 늘 많았다.
“대답 안 할 거야?”
“저리 비켜봐.”
물은 늘 검고, 또한 고요했다. 덜 자란 나체들이 뛰어들어 파동을 일으키기 전까지, 푸르른 청춘들이 세상 가장 행복한 양 서로에게 물을 튀기며 장난을 하기 전까지, 입에 머금었던 물을 뿜어내며 시름없는 웃음을 터뜨리기 전까지, 물은 침묵을, 그러니까 비밀을 지켜 주었다. 그곳이 그들만의 공간인 양 생각하도록 내버려두었다. 방관이라는 단어를 배울 기회는 둘 중 하나에게는 없었다.
덜 자란 나체들이 도망치듯 사라지고, 물은 다시 평정을 찾았다. 둘 중 하나는 그곳을 아주 가끔, 다시 찾아오곤 했다. 재회할 때마다 표정은 어두워갔으나 검은 물은 사정을 묻지 않았다. 어느 날 수척한 얼굴로 조각배를 타고 흰 가루가 든 상자를 열었을 때도, 물은 침묵을 지켜 주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