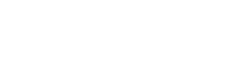top of page
전기가 올랐다.
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찌릿찌릿 몸을 관통하는 이상야릇한 기분은
한번은 오른쪽, 한번은 왼쪽으로 치우쳐지며 가슴을 간질여 날 찝찝하게 만들었다.
웃기게도 이런 기분은 삼일에 한 번씩은 꼭 아랫배에서 머리끝으로 박차고 올라왔는데, 그 시작은 아마도 석 달 전인 것 같다.
무슨 날이냐 하면, 그냥 즐겨 먹던 고구마가 그날따라 더 맛있었던 날.
그거 하나였다.
엄마의 치마 위에 달랑거리던 노리개 색을 닮은 샛노란 벼들이 더 예뻐 보인 날,
우리 집 똥개랑 같이 달리다가 넘어지던 날,
날 일으켜준 딱딱한 손이 생판 처음 보는 니놈 손이었던 날.
그날부터 전기가 내 몸속에 꿈틀꿈틀 기어 다녔다.
지랄 맞게도 기어 다녔다.
bottom of page